
어느새 계절은 앞서 달리고...
뻔질나게 들락거리면서 호들갑을 떨었지만 실제 이뤄 놓은 것 하나 없음은 채워지지 않는 이기심 때문일까.
그 열매가 크든 작든 자연의 순리는 이미 결실을 맺어가고 있음인데, 앉은 자리를 뱅뱅 돌며 빈쭉정이만 키워낸 자신이 한 없이 초라해진다.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떠오르는 해를 버거워하며 아침을 시작하고, 자신의 몫을 지키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일터로 향할 때도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한 습관적인 일상이 아니었나 싶다. 하루를 지탱하기 위해 위장과 창자를 채워주고 오늘을 싸워 이기기 위해 바둥거렸다는 허무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앉았다.
가끔 '이게 아닌데...' 싶을 때면 오만가지 상념을 담아 눈물 그렁그렁한 채 우리 대장을 바라본다. 몸이 괴로워서 더욱 그런 날이 많아지면 밉살스럽지만 자신이 평생을 책임지겠노라 장담한 댓가를 치르듯 무게로 못이기는 척 버티는 아내의 손을 잡아 끈다.
바쁘게 살아온 세월이 길었기에 지레 지쳐버린 아내에 대한 배려라고 하면 좋을 것이나 능구렁이가 다 된 아내는 알고 있다. 그가 내민 손에는 이미 한 주를 편하게 살고자 하는 애잔함이 함께 있다는 걸.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아침.
이른 산행을 위해 아직 잠에서 덜깬 한라산 허리에서 만난 녀석들.
인적도 없고 아직 짐승들도 기상하지 않았음에 산의 고요는 적막함까지도 품었다.
걷히지 않은 어둠을 밀어내며 발길을 옮기지만 들리는 것은 아직 없다. 혹여 맺혔던 이슬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싶지만 요지부동으로 여린 꽃잎에 앉은 아침 이슬은 고요와 함께 이미 숲이 되었다. 장난끼 잔뜩 오른 바람조차 없는 날에 물봉선을 삼킨 이슬이 배불러 보인다.
어찌 보면 아무 것도 아니라 치부해 버릴 수도 있음이나 잔뜩 짊어진 내 삶의 무게가 조금은 덜어낸 듯 가벼워 어깨가 산뜻하다.
지금껏 살아온 날을 뒤돌아 마음의 평정을 자연 속에서 찾았던 적은 없었다. 아니 그러고보면 어린 날 등하교 길에서 만났던 선흘곶 끝자락의 무성함이 지금의 모습을 찾게 만들어준 바탕이 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혼자 걷던 그 길이 무서울만도 하건만 겁도 없이 호젓한 우거진 숲 길을 걸었으니 저들과의 연이 이미 오래 전에 맺어졌음은 아닐지...
새벽의 싸한 공기와 함께 싱그러운 풀냄새가 폐부로 깊숙하게 스며든다.
어느새 계절은 제 몫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깊어가고 있었나 보다. 신선한 가을의 풍요가 숲의 덜깬 잠을 깨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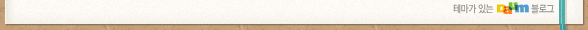
'일상의 단편 > 생각 자투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담쟁이 단풍들다! (0) | 2007.11.23 |
|---|---|
| 하루가 저물어... (0) | 2007.10.22 |
| 태풍 나리의 뒤끝... (0) | 2007.09.18 |
| 개기월식의 끝자락을 붙잡고 (0) | 2007.08.28 |
| 내가 선택한 당신. (0) | 2007.08.19 |
